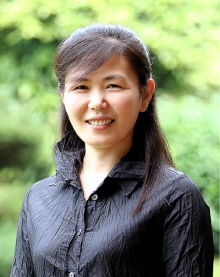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
누군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 자주 쓰이는 것이 핑계인 것 같은데 요즘의 나는 그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주고 싶어진다. 잘못한 일에 대한 구차스러운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여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은가.
들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만으로 정황을 판단하는 것은 신이거나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거의 언행을 마치 손등 뒤집듯 쉽게 뒤집었다고 비난하며 결과에만 시선을 둘 게 아니라 과정의 행간을 살피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굳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시대가 달라졌다.’ 따위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경험하는 상황과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각자가 겪는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둘 만들어가지 않을까. 마치 성을 쌓는 것처럼 쌓고 허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말이다.
작은 범위로 제한하여 한 가족을 상정해본다면 그들이 추구하며 공유하는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가족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의 갈등은 늘 진행형이다. 생활공간을 달리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갈등의 진폭이 더욱 크다. 하지만 다소의 균열을 동반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사회도 마찬가지다. 진리나 가치에 대한 독선적인 확신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며 사회를 이분화시킨다. 균열이 두려워 상대의 생각이나 입을 막아버린다면 마침내는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의 삶 혹은 사회의 고유한 영역에 누군가의 잣대를 들이대며 재단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에 버려야 할 잔재이자 적폐이다.
틈이 있는 생활, 관계의 균열, 그 이상의 것을 허용하고 싶다. 사고의 기본적인 틀에 하나씩 어깃장을 놓으며 흔들어대고 싶다.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마침내는 내가 속한 사회의 정의正義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하게나마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혁신이 아닌 성장이다.
아무 말 잔치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어떤 것일까.
철학적 고뇌의 산물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정치적으로 희화화되어 소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던져놓은 사회적 담론을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핑계 따윈 없을 것 같은 산담 너른 무덤 앞에 앉아 귀 기울여주고 싶다. 옹색한 핑계이든 누추한 사연이든 다 들어보고 싶다. 옹색과 누추 사이를 추처럼 움직이는 빈틈 있는 생활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절대악이니 절대선이 하는 시점과 종점 따위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무수한 점의 사연들을 들여다보고 싶다. 마음자리가 옹색해지면 삶도 더불어 누추해지지 않겠는가.
핑계 아닌 마음속 사연을 다 들어보마.
핑계는 청자의 잣대일 뿐, 화자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향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약력
-창조문학으로 등단
-제주문인협회 회원
-제주수필문학회 회원
-수필집 《콩잎에 자리젓》 출간


